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남상준기자]
타 유럽 리그와 다르게 오로지 독일의 분데스리가만 고수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50+1' 정책이다. '50+1' 규정이란 독일 축구 연맹 DFB가 클럽 자체나 클럽 팬들이 클럽 지분의 51% 이상을 차지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 자본이나 중동의 오일머니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리그가 상업 축구가 아닌 자국 축구팬들을 위한 축구로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이 룰은 분데스리가의 차별화된 자부심이자 리그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므로 비판적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장점은 재정의 건전성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망이 좋을 수 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아도 구단이 스스로 잘 자립한 경우도 있는데, 성공적인 구단의 예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이다. 특정적인 거대 자본의 손길을 거부하고 다양한 스폰서를 유치하여 구단 재정을 충당한다. 이 외에도 큰돈으로 외국 스타 선수를 영입하기보다는 구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유스 시스템에 투자하여 어린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성장하여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하다. 지적되는 단점 중 하나는 리그 경쟁력 악화이다. 이 룰로 인해 축구팬들에게 분데스리가는 셀링클럽이 많은 셀링리그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사실 분데스리가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의 라리가에 비해 스타 선수 영입도 적고 분데스리가의 재능 있는 선수들도 EPL이나 라리가에서 비싼 이적료로 데려가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한다는 이미지도 강해서 전체적인 분데스리가의 위상이 저하된다는 말도 있다. 바이에른 뮌헨뿐만 아니라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도 UEFA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이 뛰어나야 하는데 자국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여 뎁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클럽들은 오일머니를 앞세워 재정이 튼튼하고 좋은 팀을 꾸릴 수 있지만, 특정 거대 자본이 망한다면 순식간에 파산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 축구 연맹 총회의에서는 '50+1' 제도의 존폐에 대한 안건도 있었지만 34개의 참가구단 가운데 18개의 구단이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어 규정이 폐지되지는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사장인 칼-하인츠 루메니게의 말처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위해서는 머지않아 폐지 혹은 개정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6기 남상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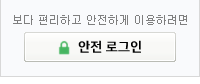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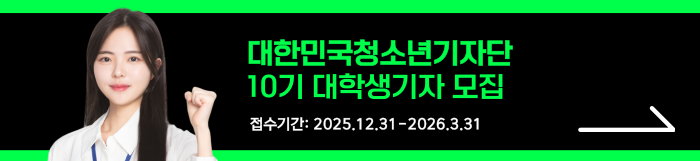
 워터파크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가?
워터파크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가?
 지금 당신이 보는 MBTI 결과는 틀렸다?
지금 당신이 보는 MBTI 결과는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