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라는 제도를 아는가?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와 불화 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 기구가 개별 국가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해운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도현기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로,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의 단계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만큼 배출권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뽑히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과 같은 건데, 2015년 1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탄소배출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어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말자는 취지에서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는 각종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탄소 배출권’을 사 와서, 일정량을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에 어느 정도 할당량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어떤 중소기업은 탄소를 적게 배출해 ‘탄소배출권’이 남지만, 대기업들 같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이 모자랄 때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탄소배출권거래제'이다.
파리에서 협약을 맺은 이유는 지구에게 배출되는 탄소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다. 선진국이 땅이 크고 많은 공장량을 가지고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양을 타이트하게 잡는다. 선진국은 과거에 많은 탄소를 배출한 이력이 있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 되기에 오히려 탄소 배출량에 대비 파리협약에서는 배출권을 타이트하게 잡는다. 그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기준을 가볍게 잡는다.
그래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거래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이 많이 남는다. 그걸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 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에게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을 투자해야 해외자본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사 올 수 있다.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여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 년에 전 세계에서 탄소를 이만큼만 배출하자라는 기준을 세워놓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파리기후협약은 말한다.
탄소배출량의 측정은 굴뚝에 측정기를 달 수도 있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연료와 재료의 투입량만 보고 배출량이 어림잡아 나오기 때문에, 측정은 어렵지 않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우리나라 기준 현재 1톤에 2만 6000원을 웃돌고 있다. 일 년 전의 가격은 2만원 초반으로 시작했었고, 탄소 배출제가 시행된 초기엔 7700원이었다. ‘탄소배출권’을 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처벌 과징금이 붙는다. 과징금은 톤당 3배 이상의 벌금을 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기준이 타이트하지 않아 과징금을 낸 곳은 전국에 한 곳이다.
‘탄소배출권’의 취지는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규제의 취지와 원리가 같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속히 안정화가 되어 후세대에 깨끗한 하늘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1기 김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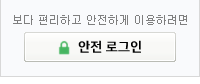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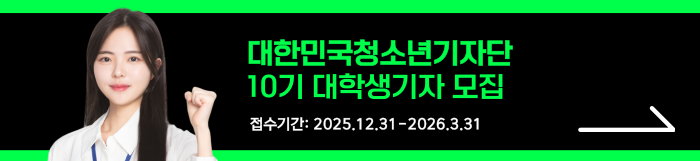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