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최원영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단어들이다. 3월, 몇날며칠을 웅크려있었던 차가웠던 날들이 따뜻함에 깨어날 때쯤, 어쩌면 우리는 더욱 추위를 타는지도 모르겠다.
익숙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알지 못했던 낯선 것들 속으로 파고드는 시간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어렵고 아프다. 학기 초, 옛 친구들과 나누는 대부분의 대화는 ‘적응할 수가 없다,’ ‘친구가 없다,’ 등 앓는 소리로 넘쳐난다. 필자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열한 번의 새학기를 겪었고, 어느덧 그 시간들이 조금은 체화되었다. 낯선 게 당연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시점이고, 내가 어색해하는 그 누군가도, 같이 호흡하는 그 공기의 어색함에 짓눌려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함께하게 되는 방법의 변화다.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타인과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놓았다. 그것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의 부분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흔히들 ‘반톡’이라고 부르는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런저런 공지사항들이 오가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있는 글들만이 다음 날,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주며, 친분은 얼굴을 맞대며 나누어지는 게 아닌, 활자 속에 가려져있는 서로에게서부터 쌓아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내세우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들은, 되려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로 유리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잘 모르겠다. 필자 역시도 교감의 매개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손에 쥔 채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오는 단절감과 소외의 크기가 커져나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시간들로 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간이 그리워질 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최원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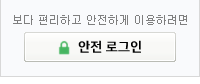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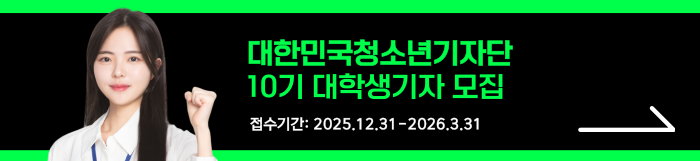
 스페인 발렌시아의 대표음식, 빠에야
스페인 발렌시아의 대표음식, 빠에야
 인천 남동구 도림주공아파트, Earth Hour 운영
인천 남동구 도림주공아파트, Earth Hour 운영


